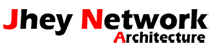감나무에 단풍 드는 全南전남의 9월
김유정
이봐요, 저 감이 이 하루 이틀 아주 골이 붉었구료. 아직 큰 바람이 일지는 않겠지요. 참, 그보다도 저 감잎 물든 것 좀 보아요. 밤중에 들었는가, 새벽녘에 들었을까.
이번은 그 첫물 드는 꼭 그 시간을 안 놓치고 보리라 했더니 올해도 또 놓쳤구료. 감잎은 퍽은 물들기가 좋은가 보아, 그러기에 보리라 보리라 벼르는 내 눈을 기어이 속이고 어느 틈에 살짝 물이 들었지. 그 옆에 동백나무는 사시 푸르고만 있잖은가. 만일 동백이란 열매라도 맺지 않는다면 저 나무는 참으로 이 가을철을 모르는 싱거운 나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시 애가 없이 푸르청청하고 있대서 싱겁달 나무는 아닙니다. 그 동백이 바로 그저께부터 십자로 쫙쫙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두꺼운 푸른 껍질이 쫙 벌어지면 까만 알맹이 동백이 토르륵 하고 빠져 쏟아지는데 풀 위에 꿈을 맺는 이슬같이 구르지요. 달밤에 감이 툭툭 떨어져선 깨쳐지는 이슬이 빛나는 것도 좋지마는 동백 한 알이 토록 하는데 그이는 고개를 슬쩍 들고 그 서슬에 나는 흘긋 건너다보고 그 밤은 무던히 좋은 꿈을 꾸며 자는 적이 많습니다.
그 불타는 꽃의 정열에 비기어 그 알이 하나 빠지는 것은 어찌 그렇게도 枯淡고담한가! 하늘에 별이 포감포감 박혔듯이 새빨간 꽃이 포기포기 그 싯푸른 잎새마다 하나씩 맞물고 맞물리우고 있지 않았는가. 동백잎같이 진하게 빨간 꽃은 없습니다. 동백나무를 어느 누가 화초로 가상타 하여 가꿀까요.
내 마음과 뜻이 자꾸자꾸 퇴색하여 가는 때 다시 물들여 주고 되살려 주는 내 생명의 나무인 것을. 그 동백이 까만 껍질에 싸인 씨가 있고 그 놀미한 씨를 짜면은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그이의 검은 머리칼을 윤내어 주는 줄은 알지마는 과연 귀여운 요새 여인네들이 바르시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동백잎과 꽃에 그리도 많이 길리운 내 마음이 그 잎과 꽃의 정열보다도 그 알의 고요히 빠지는 정숙을 이다지도 좋아해졌을까 스스로 의심스럽소. 달이 밝고 바람은 살래살래 흘러드는 서늘한 9월 밤이요, 마루간에 가끔한 마리씩 쫓기어 드는 모기를 날리면서 핼쓱해져 가는 구름이나 바라고 앉았노라면 밤도 깊습니다. 동백은 바로 풀 위의 이슬 위에 받습니다. 톡, 토륵, 토르륵, 셋이 빠진 듯하면 좀 사이를 둡니다. 다른 놈이 또 빠질 그 사이가 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신통하오. 일어서서 안 나아갈 수 없나이다.
달빛이 희고 이슬이 빛나는데 토륵 하는 동백 한 알, 천지의 오묘하고 신비함이 이 밤 그 나무그늘 밑에 있는 듯싶습니다. 나는 눈이 어둡지 않아 이렇게 좋을 데가 없소이다. 귀가 막히지 않아 이리 복 될 데가 없습니다. 나는 내 고향이 동백이 클 수 있는 남방임을 감사하나이다. 잎과 꽃의 그 봄이 시들었음이 아니로되, 동백 한 알이 빠져 이 긴 밤의 이리 고요하고 느껴움은 이 철 9월이 주는 은혜외다.
어리석은 나이는 자꾸 늘어 슬픈 일도 되오마는 그 나이를 안 먹고 있으면 보다 더 슬픈 일이지요. 막연하게나마 인생의 깊숙한 맛은 나이가 먹어가야만 정말 맛볼 것만 같소이다. 차차 봄을 떠나는 맛이요, 웃옷 벗고 푸대님으로 거니는 맛이요, 말없이 마루간에 혼자 앉았는 맛이지요. 비록 “옷을 벗어 갈수록 예뻐지는 내 여인아” 하는 그 裸體나체 예찬은 아닐지라도 이따금 벌거숭이로 거닐어 보고 싶은 때가 있소이다.
9월에 감이나 동백만이 열매이오니까, 오곡백과지요. 뜰 앞에 은행나무는 우리 부자가 땅을 파고 심은 지 17, 8년인데 한 아름이나 되어야만 은행을 볼 줄 알고 기다리지도 않고 있었더니 천만의외이 여름에 열매를 맺었소이다. 몸피야 뼘으로 셋하고 반, 그리 크잖은 나무요, 열매라야 은행 세 알인데 전 가족이 이렇게 기쁠 때가 없소이다. 의논성이 그리 자자하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이라 서로 맞대고 기쁜 체는 않지만 아버지도 기뻐합니다. 아들도 기뻐합니다. 엄마가 계시더면 고놈 세 알을 큰 섬에 넣어 가지고 머슴들을 불러대어 가장 무거운 듯이 왼 마당을 끌고 다니시는 것을. 봄에 은행잎은 송아지 첫 뿔나듯이 뾰족하니 돋기 시작하여 차차 나팔같이 벌어지고, 한여름은 동백잎에 못지 않게 강렬히도 태양에게 도전하고, 이 가을 들어선 바람 한 번에 푸름이 가시고 바람 한 번에 온통 노래지고 바람 한 번에 아주 흩어지는데 다른 단풍 같지 않고 순전히 노란빛이 한 잎, 두 잎 맑은 허공을 나는 것은 어떻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 노령이신 아버지라 말씀이 없고 괴벽인 아들이라 말이 없고 50생남쯤 되는 이 열매를 처음 보고도 서로가 은연히 기뻐할 뿐이외다.
어린 놈이 “그 은행 익으면 조부님 젯상에 놀래요.” 하는 데는 破興파흥 아니할 수 없나이다. 이 아침에 동백이 또 토록 하는 통에 내 맨발로 또 금빛 이슬을 깨칩니다. 청명을 들이마시며 거닙니다. 시 ─ 실 ─ 호 ─ ㄹ 호르르르르 ─ 저 대삽(숲) 속에서는 호반새가 웁니다. 碧眼黑毛벽안흑모 긴 꼬리를 달고 날면 그림자만 알릉거리는 것 같은 호반새 종다리 소리 같고도, 더 맑은 꾀꼬리 소리 같고도, 더 점잖은 가락은 요새 아침마다 연약한 벌레 소리를 누르고 단연 하이든의 안단테 칸타빌레를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참새들은 집에 붙어 있질 않습니다. 고놈들의 넓은 목장이 있는 탓입니다.
후여후여 까까 ─ 후여 새를 몰고 쫓는 소리올시다. 어떤 때는 예사로 멋도 있게 들리는 후여까까, 그 애들의 헐벗은 옷이 축축 늘어진 벼이삭과 함께 아침 이슬에 후줄근히 젖었을 것입니다. 나락을 심어 먹기 시작한 때부터의 이 후여까까 소리, 만리 이역을 가시더라도 이 가을 아침이 되면 귀에 익어 쟁맹할 그 소리는 우리들의 살 속 깊이 스며든 지 벌써 오랜 옛날이외다. 대삽에서 우렁찬 바람이 터져나옵니다. 지용의 ‘청대나무’입니다. 대에 나무를 붙여서 읊는 지용은 용하게도 동백을 椿춘나무라 읊습니다. 대나무의 고장인 이곳에선 삼척동자라도 대지, 대나무는 아니합니다. 그 대밭이 하도 많이 큰 게 있어서 한 동리의 한 촌락을 흔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대밭을 대삽이라 부르지요. 죽순이 송아지 뿔나듯이 나오면 한 자 자랄녘에 끊어서 나물을 만들어 먹는데 그 맛이 천하일품, 그리하여 평양서는 굳은 큰 대를 잘라서 삶는다는가 봅니다. “이른봄 3월이니 남도에는 죽순이 났겄다”고 하신 시인이 계신 듯하나 죽순은 6월 초에야 지각을 뚫고 나옵니다. 그 놈이 죽순일 때에 다 커버리고 2년이 되면 다 굳어 버리어 설풍을 이겨냅니다. 「눈 맞아 휘어진 대의」 시조가 생긴 탓입니다. 9월 중추 명월 이 곳 남녀 젊은이의 盛事성사는 〈강강수월래〉의 원무회와 장정들 씨름판이외다.
부녀의 원무회는 새벽 한시경이면 헤어지지마는 시새워서들 성장을 꾸미고 출회하던 양이 볼 만하고 장정들의 씨름판은 밤을 새우고 東天江동천강이 되더라도 좀처럼 끝나지를 않습니다. 대개는 5, 6일쯤 같은 기간을 두고 농촌 장정 부녀는 연중 가장 유쾌합니다. 그도 그럴 일이지요. 오곡이 다 익었거든요. 명월은 그렇듯이 젊음을 꾀어낼 만하거든요. 아무튼 이 두 행사는 이곳의 아름다운 情調정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9월도 늦어갑니다.
마루 끝의 발을 걷어치웁시다.
도시 말로 하이킹을 나서 볼까, 정병 5, 6인 손끝에 날랜 대창을 지녔소. 곧 산에 오르는 스틱이요, 밤 까는 창이외다. 배낭에 술을 넣을 것은 없습니다. 산중에라도 술잔이나 주는 사람이 없을라구요. 술잔이나 마시면 익혀논 육자배기가 가을 하늘에 높이 뜹니다.
평지에서 바라다보아도 그 톱니 같은 산봉우리들, 발밑이 간지러운 月出山월출산은 단풍의 불타는 골짜기로 쌓였고 그 天王峰천왕봉 · 九鼎峰구정봉에서는 논 문서를 올려다가 자식들 불러 나눠주고 千萬代孫孫 莫登月 出山천만대 손손 막등월 출산하라고 유언하신 군자가 계신 만큼 험한 곳이지요. 尹孤山윤고산은 月出山월출산 시조로 무던히 사랑했던 곳이요, 그 산뿌저리에 無爲寺무위사 있고, 吳道子오도자의 벽화가 절품입니다. 丁茶山정다산이 계시던 百蓮寺백련사는 남쪽 구강 위에 우뚝 솟은 선경이요, 竹島죽도 앞에 매일 배타고 일월을 보낸 茶山다산의 늠름한 풍모를 그려 볼 수 있나이다. 고래 수백 년이 강물 위를 배타고 적소 참하신 한 많은 선비, 얼마나 많았을까. 南兵使營남병사영이던 병영 평야에 경병사병의 조련소리도 그치고 그 뒤 修仁山城수인산성도 가을 단풍만 곱습니다. 소속을 長興장흥과 다루는 동남의 천관산에 흰 수건 쓴 호랑이 백주에 돌아다니시고 그 산 밑에 청자기 굽던 자리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산 흙을 더러 가지러 오고 채굴 이상 금도 성행하오. 골의 주봉 보은산 牛頭峰우두봉에 가을의 정기인 듯 쫙 깔린 산국화를 깔고 앉아 사면을 굽어보면 일폭 산수도에 들어앉은 선인이요, 구강이 하얗게 흘러흘러 제주에 이름을 봅니다. 그대로 외줄기 봉을 타고 백두산 상봉까지 삼천리 기어오를 것 같소이다.
康津강진 · 海南해남을 아실 이가 드물지요. 鏡源경원 · 鐘城종성을 잘 모르듯이. 그러나 거기서 여기가 꼭 삼천리, 쩔웁고 좁아서 우리의 한이 생겼는 것을 더러 서울 친구들은 지도를 펴놓고 멀다멀다 오기를 무서워하나이다. 고향살이 십여 년, 옛날의 思鄕歌사향가 · 懷鄕病회향병은 찾을 수 없소. 오히려 멀리 타향 가 계시는 죽마고우가 그리워지고 그리하여 등산대원이 차차 줄어드는 세상이 되고 보니 고향이랬자 쓸쓸할 뿐이외다. 올해도 강강수월래 씨름판을 못 설 겝니다. 이 가을도 쓸쓸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