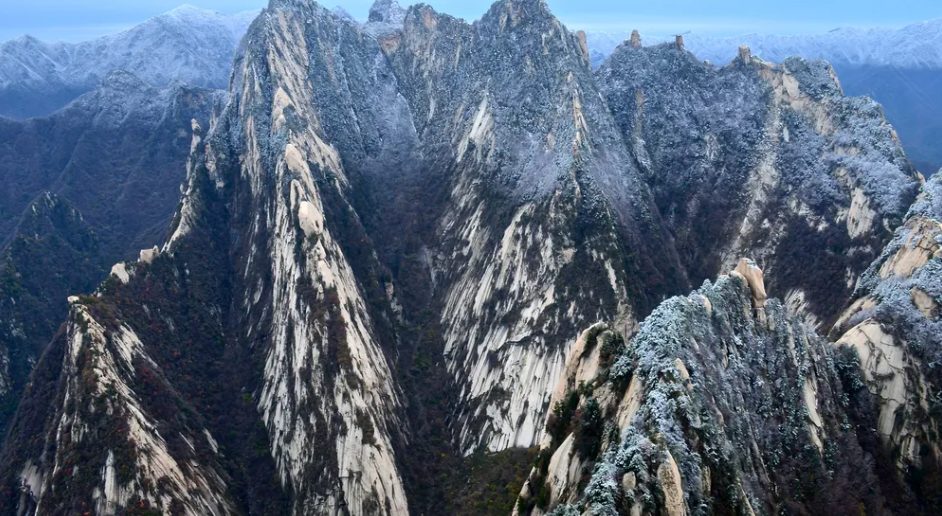한국도교사상
1. 한국도교의 기원
(1) 중국으로부터의 전래설
한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고구려 영류왕(榮留王) 7년(624) 당(唐)의 고조(高祖)가 도사(道士)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원시천존상 및 도법(道法)을 전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중국·일본 등 국외 도교학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이다.
(2) 본토 자생설
교단으로서의 체계를 갖춘 중국의 도교가 당(唐) 시대에 처음 한국으로 전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단 도교 성립 이전의 원시도교 문화, 예컨데 신선(神仙)에 대한 동경 및 숭배 관념 같은 것은 한국에도 자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한국 도교학자들의 입장이다.
→ 한국 도교는 고대 한국 문화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원시 도교적 요소, 그리고 후대에 한국에 전래된 조직화되고 이론화된 중국 도교가 결합하여 이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도교의 특징
(1) 고구려
① 『삼국유사』에 7세기 초 고구려의 만간에서 오두미도(五斗米道)가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② 영류왕(榮留王) 7년(624), 당(唐)의 고조(高祖)가 도사(道士)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원시천존상 및 도법(道法)을 가지고 오고, 『도덕경(道德經)』을 강설하였다.
③ 보장왕(寶藏王) 2년(643), 당시의 권신(權臣)인 연개소문의 적극적인 건의에 의해 도교를 다시 들여오게 되었다. 이 때 당의 태종(太宗)이 고구려 왕의 요청을 받고 도사 8명과 『도덕경(道德經)』을 보냈다. (연개소문의 도교 수입은 고구려 눈개의 불교 세력을 누르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유교·불교와 함께 도교를 정립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2) 백제
① 백제에 정식으로 도교가 전래한 기록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일찍부터 도교문화에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일본의 세이코 천왕 10년(602) 백제의 중 관륵(觀勒)이 일본으로 건너가 천문·역법·둔갑·방술 등에 관한 서적을 전했다는 『일본서기(日本書記)』의 기록은 백제에 이미 도교가 존재했었다는 방증이 된다.
③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 매지권(買地卷: 도교 장레의식 시 사용), 산경문전(山景文塡: 무늬가 있는 벽을돌) 등의 유물들을 통해 백제에 도교 문화가 성행했으리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3) 신라
① 신선과 관련된 설화 자료가 많아 토착사상·종교·민속 등에서 이미 도교문화와 상관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② 중국 도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신라의 정치, 종교적 조직인 화랑도는 상무(尙武)적인 기풍과 아울러 도교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③ 신라 고분들에서 운모(雲母: 화강암 같은 광물) · 주사(朱沙: 눈 맑게, 환각 효과)와 같은 선약(仙藥)의 재료들이 발견되어 4~6세기 경에도 이미 신선사상이 성행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통일신라
① 단정파(丹鼎派) 도교가 전래되어 지식 계층 사이에서 유행 하였다. 최승석(崔承祏) · 김가기(金可紀) · 승자혜(僧慈惠) 3명이 당에 유학하여 내단학(內丹學: 호흡 ≠ 외단학: 약물제조)을 전수받고 도교의 수련법을 전파했다.
② 최치원(崔致遠)의 《주계원필경(柱桂苑筆耕)》에는 그가 당에 있을 때 도관(道觀)에서 재초에 쓴 청사(靑詞: 도교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는 축문. 이 축문은 보통 푸른 종이에 쓰는 까닭에 ‘청사’라고 함)가 수편 들어있는데, 이는 도교사상을 전해줌과 동시에 고려시대에 성행되는 청사늬 모범이 된다.
③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부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초(齋醮) 방법을 호소하는 방술적인 신앙으로 전개되어 국가와 민간 서민층에 두루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었다.
④ 도교 구련법은 대체로 개인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많은 설화를 남기면서 주로 지식인들 사이에 전승되어 내려갔다.(이때까지는, 귀족적 도교 성향임)
(5) 고려
①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건국 초기부터 왕실에서 도교를 애호하였다.
② 불교행사였던 팔관회(八關會:도교+불교+무속 성격)의 내용을 도교적인 면에까지 확대하여 천신(天神) ·오악(五嶽) ·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대한 제사를 시행하였다.
③ 초성처(醮星處: 제사 모시는 곳)로서 구요당(九曜堂: 도교의 제단)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왕권 확립의 차원에서 도교를 당시의 호국불교와 같은 취지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이다.
④ 복원궁·전단·성수전·장사색·태청관·소격전 등 15개소의 도교 의례를 수행하는 기관이 설치되고, 본명성수초·북도초·태일초·성변기양초·삼계초·백신초·천성초 등 갖가지 명목의 초제(醮祭)가 시행되는 등의 성황을 이루게 된다. 특히 복원궁은 국가를 위한 도교의 재초 행사를 수립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의례가 체계화 되고 도사 배출을 위한 법도가 갖추어졌다.
⑤ 고려도교를 과의(科義)도교라고 부르는 것은 의례를 중심으로 한 도교가 상당히 유행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⑥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교가 장려됨에 따라 일반 지식 계층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도교수련을 하거나 노장학(老莊學)을 하는 기풍이 형성되고, 문학작품을 통해 도가·신선사상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6) 조선
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조선 시대에는 도교 성행에 따라 설치되었던 복원궁과 도교의례기관이 거의 모두 폐지된다.
② 모든 초례 장소를 폐지하고 소격전 한 곳만이 남게 되는데, 세조(世祖) 때에 이르러 소격서(昭格署)로 개칭된다. 이것은 소격서가 종교적 기능성을 존중 받기보다 단순히 국가의 행적적인 한 관서로 전락되었음을 의미한다.
③ 조광조(신진사림: 주희중심 성리학만 정파, 나머지는 사파 주장)의 소격서 혁파 사건으로 소격서는 페지되었고, 기묘사화(己卯士禍) 이후로 부활되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완전히 폐지되었다.
④과의도교(고려) → 수련도교(조선)으로의 특징의 변화가 생겼다. 그려 도교의 국가적, 과의적인 특징이 사적, 구련적인 것으로 바뀌어 단학파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단학파는 일부 사족(士族) 계층을 중심으로 내단학(內丹學)을 연구, 수련하는 기풍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도통 계통을 말한다.
⑤ 민간에서는 소박한 기복(祈福)적 취지와 실천 가능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권선서(勸善書)의 유행으로 조선 후기 민간 도교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수련도교→민간도교)
⑥ 조선 말기에 이르러 왕조 통치의 한계가 극점에 달하면서 민중들의 도교의식은 기존 질서의 해체와 재통합을 목표로 하는 민중 종교의 이념에 수용되어 신종교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3. 한국도교의 세계관
• 조화로운 의식와 원융(圓融)적 세계관
한국 원시 도교와 중국도교와의 융합을 통한 한국도교의 세계관은 최고신과 다신(多神), 토착신과 외래신이 공존하여 이룩해 낸 우주적 질서 안에서 인간 만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제의를 통해 장생(長生) · 기복(祈福) · 소재(消災) 등 모든 소망이 달성될 수 있다는 조화로운 의식과 원융(圓融)적 세계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