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단순하다면 정의도 단순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플라톤은 말한다.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로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상상에 맡긴다.
그러면 우선 그들의 생활이 어떠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들은 곡물 · 술 · 옷 · 신발을 생산하고 스스로 집을 짓지 않겠는가? 그리고 집을 갖게 되면 그들은 통례대로 여름에는 옷을 벗고 맨발로 일하며, 겨울에는 옷을 충분히 입고 신을 신고 일할 것이다. 그들은 보리와 밀을 주식으로 삼을 것이고 밀을 빻고 밀가루를 개서 맛있는 푸딩과 빵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이 음식을 갈대잎이나 나뭇잎으로 짠 돗자리에 차려 놓고 주목(朱木)이나 도금양(桃金孃) 가지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손수 빚은 술을 마시고 머리 위에 화관을 쓰고 신들을 찬미하며 잔치를 열 것이며 즐거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족 수가 생활 수단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그들은 가난이나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소금 · 올리브 기름 · 치즈 · 양파 등 양념과 양배추나 그 밖의 끓여 먹기에 알맞은 야채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디저트로 무화과 · 콩 · 도금양 열매 · 너도밤나무 열매 등을 내놓으면 그들은 이것을 구워 안주삼아 적당히 술을 마실 것이다.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적당한 노령에 이르기까지 평화롭게 살고 똑같은 생활을 대대로 물려 주려고 할 것이다.(《공화국》)
여기서 인구 제한(아마도 영아 살해), 채식주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즉 헤브라이의 전설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있는 원시적 단순성으로 돌아가라는 사상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주의하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동물에게 돌아가 동물과 함께 살아야 한다. 동물은 평온하고 자족적이다’라고 그 형용사가 암시하듯이 생각한 견유(犬儒) 디오게네스의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플라톤을 생 시몽, 추리에, 윌리엄 모리스, 톨스토이와 같은 부류로 분류해도 좋으리라. 그러나 플라톤은 따뜻한 신념을 가졌던 이 사람들보다는 약간 더 회의적이다. 그는 조용히 그가 상상하고 있는 소박한 낙원이 왜 실현되지 않는가, 왜 이 유토피아가 지도위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문제로 넘어간다.
그는 탐욕과 사치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사람들은 단순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욕심과 야망, 경쟁심과 질투심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갖고 있는 것에는 곧 싫증내고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갈망한다. 인간은 남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면 탐내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 간의 영토 침범, 토지 자원의 쟁탈전으로 인해 마침내는 전쟁이 일어난다. 상업과 경제의 발달로 새로운 계급 분열이 생긴다.
‘보통의 도시는 사실상 두 개의 도시로 갈라져 있다. 하나는 가난한 자의 도시이고 또 하나는 부자의 도시로 두 도시는 서로 다투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더 작게 쪼갤 수 있다. 만일 당신들이 이 도시를 단일한 국가로 다룬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공화국》)
상업 부르주아가 대두하고 그 구성원은 부(富)와 낭비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아내를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할 것이다.'(《공화국》)
부(富) 분배의 이러한 변화에는 정치적 변화가 따른다. 상인의 부가 지주의 부를 능가하면 귀족 정치는 금권적 과두정치에 굴복한다. 부유한 상인과 은행가가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여러 세력을 조정하고 정책을 발달에 적응시키는 정치는 당리당략(黨利黨略)과 공직의 부패를 부채질하는 정략(政略)으로 바뀐다.
모든 정치 형태는 기본 원칙의 과잉으로 멸망하는 경향이 있다. 귀족정치는 권력층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멸망하고, 과두정치는 목전의 부를 에워싼 무모한 쟁탈전 때문에 멸망한다. 두 경우에 있어서 종말은 혁명이다. 혁명은 사소한 원인과 보잘것없는 변덕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경미한 계기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중대한 악(惡)의 돌연한 결과인 것이다. 병을 소흘히 다루면, 조금만 바람을 맞아도 중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민주정치가 등장한다. 가난한 자들은 반대자를 타도하고 일부는 학살하고 나머지는 추방한다. 그리고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분배한다.'(《공화국》)
그러나 민주정치도 민주주의 과잉으로 멸망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누구에게 공직 취임과 공공정책 결정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즐거운 제도 같지만 인민은 최선의 통치자와 가장 현명한 방향을 선택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민주정치는 재난이 된다.
‘인민을 보면 그들은 이해력이 없고 지배자들이 말하는 것을 되출이할 뿐이다.'(《프로타고라스》)
어떤 이론을 채택하거나 배척하게 하려면 인기극에서 찬양하거나 조롱하면 된다(이것은 희극으로 거의 모든 새 상을 공격한 아리스토파네스에 대한 공격이다).
중우정치(衆愚政治)는 국가라는 배가 저어 가기에는 너무나 거친 바다이다. 웅변의 폭풍우가 휘몰아쳐서 물결이 사나워지고 방향을 빗나가게 한다. 이러한 민주정치의 결말은 참주정치(僭主政治) 또는 전제정치(專制政治)이다. 민중은 매우 아첨을 좋아하고 꿀맛에 주렸기 때문에 마침내 가장 교활하고 가장 파렴치한 아첨쟁이가 인민의 보호자를 자칭하면서 최고의 권좌에 오른다(로마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
플라톤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할수록 변덕스럽고 속기 쉬운 민중에게 정치적 요직의 선발을 맡겨놓는 어리석음에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정치의 무대 뒤에서 과두정치의 꼭두각시를 조종하고 있는 부자의 주구(走狗)들은 음흉한 모사(謀士)들에게 요직의 선택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은 간단한 문제, 예컨데 제화(製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자들만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는 투표를 조종할 줄 알면 누구든지 도시나 국가를 다스릴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전문적 교육과 기술적 숙련을 보증하는 면허증을 가진 전문 의사를 부른다. 미남 의사나 구변이 좋은 의사를 부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국가 전체가 병들었을 때,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의 봉사와 지도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공직으로부터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고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가장 훌륭한 인물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방법의 발견이야말로 정치철학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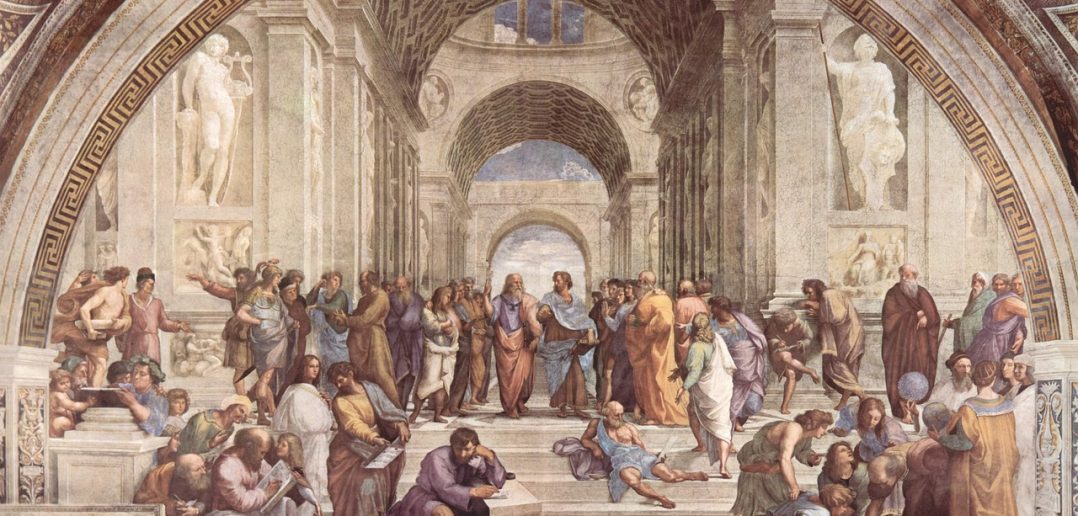
1개의 댓글
You can definitely see your expertise in the work you write. The world hopes for even more passionate writers like you who aren’t afraid to say how they believe. Always go after your 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