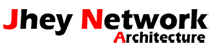“에그, 어서 말씀 좀 시원히 하여 주십시오.”
“글씨는 처음 보는 글씨일세.”
본래 옥련이가 일곱 살에 부모를 떠났는데, 그때는 언문 한 자 모를 때라. 그 후에 일본 가서 심상소학교 졸업까지 하였으나 조선 언문은 구경도 못 하였더니, 그 후에 구완서와 같이 미국 갈 때에 태평양을 건너가는 동안에 구완서가 가르친 언문이라, 옥련의 모친이 어찌 옥련의 글씨를 알아보리요. 부인이 편지를 받아 보니 겉면에는,
한국 평안남도 평양부 북문내 김관일 실내 친전
한편에는,
미국 화성돈 ○○○호텔
옥련 상사리
진서 글자는 부인이 한 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만 ‘옥련 상사리’라 한 글자만 알아보았으나, 글씨도 모르는 글씨요, 옥련이라 한 것은 볼수록 의심만 난다.
“여보게 할멈, 이 편지 가지고 왔던 우체 사령이 벌써 갔나. 이 편지가 정녕 우리집에 오는 것인지 자세히 물어 보았더면 좋을 뻔하였네.”
“왜 거기 쓰이지 아니하였습니까?”
“한 편은 진서요 한 편에는 진서도 있고 언문도 있는데, 진서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언문에는 옥련 상사리라 썼으니, 이상한 일도 있네. 세상에 옥련이라 하는 이름이 또 있는지, 옥련이라 하는 이름이 또 있더라도 내게 편지할 만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작은아씨의 편지인가 보이다.”
“에그, 꿈같은 소리도 하네. 죽은 옥련이가 내게 편지를 어찌 하여…….”
하면서 또 한숨을 쉬더니 얼굴에 처량한 빛이 다시 난다.
“아씨 아씨, 두말씀 말고 그 편지를 뜯어 보십시오.”
부인이 홧김에 편지를 박박 뜯어 보니 옥련의 편지라.
모란봉에서 지낸 일부터 미국 화성돈 호텔에서 옥련의 부녀가 상봉하여 그 모친의 편지 보던 모양까지 그린 듯이 자세히 한 편지라, 그 편지 부쳤던 날은 광무 육년(음력) 칠월 십일일인데, 부인이 그 편지 받아 보던 날은 임인년 음력 팔월 십오일이러라.
부산 절영도 밖에 하늘 밑까지 툭 터진 듯한 망망대해에 시커먼 연기를 무럭무럭 일으키며 부산항을 향하고 살같이 들어닫는 것은 화륜선이다.
오륙도, 절영도 두 틈으로 두 좁은 어구로 들어오는데 반속력 배질을 하며 화통에는 소리가 하늘 당나귀가 내려와 우는지, 웅장한 그 소리 한마디에 부산 초량이 들썩들썩한다. 물건을 들이고 내는 운수 회사도 그 화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보내고 맞아들이는 여인숙에서도 그 화통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화륜선 닻이 뚝 떨어져서 삼판 배가 벌떼같이 드러난다. 부산 객주에 첫째나 둘째 집에는 최주사 집 서기 보는 소년이 큰사랑 미닫이를 열며,
“여보시오, 주사장. 진남포에서 배 들어왔습니다. 우리 짐도 이 배편에 왔을 터이니 사람을 보내보아야 하겠습니다.”
최주사는 낮잠을 자다가 화륜선 화통 소리에 잠이 깨어 일어나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터이라. 서기의 말을 들은 체 만 체하고 앉았다가 긴치 않은 말대답하듯,
“날 더러 물을 것 무엇 있나.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소년은 서기 방으로 가고 최주사는 큰사랑에 혼자 앉았더라.
최주사는 몇 해 동안에 재물이 불 일어나는 듯 느는데 그 재물이 늘수록 최주사의 심회가 산란하다. 재물을 모을 때는 욕심에 취하여 두 눈이 빨개서 날뛰더니 재물을 많이 모아 놓고 보니 재물이 그리 귀할 것이 없는 줄로 생각이라. 빈 담뱃대 딱딱 떨어 물고 물부리를 두어 번 확확 내불어 보더니 지네발 같은 평양 엽초 한 대를 담아 붙여 물고 담배연기를 혹혹 내불면서 무슨 생각을 하다가 혼자말로 탄식이라.
“재물. 재물. 재물이 좋기는 좋지만은 제 생전에 먹고 입고 지낼 만하면 그만이지. 그것은 그리 많아 쓸데 있나. 몸 괴로운 줄 모르고 마음 괴로운 줄 모르고 재물만 모으려고 기를 버럭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흥, 어리석은 것도 아니야. 환장한 사람이지. 풀 끝에 이슬 같은 이 몸이 죽은 후에 그 재물이 어찌 될지 누가 알 바 있나. 적막한 북망산에 돈이 와서 일곡이나 하고 갈까. 흥, 가소로운 일이로고. 내 나이 육십여 세라. 인생 칠십 고래희라 하였으니 내가 칠십을 살더라도 이 앞에 칠팔 년 동안 뿐이로구나. 아들은 양자. 딸은 저 모양. 어― 내 팔자도 기박하고. 옥련이나 살았더면 짐짓이 마음을 붙였을 터인데, 그런 불쌍한 일이 있나. 오냐, 그만두어라. 집안일은 잘 되나 못 되나 서기에게 맡겨 두고 평양 가서 딸도 만나 보고 미국 가서 사위나 만나 보고 오겠다.”
마침 문간이 들석들석하더니 무슨 별일이나 있는 듯이 계집종들이 참새떼 재잘거리듯 지껄이며 사랑 마당으로 올라 들어오는데 최주사는 혼자 중얼거리고 앉아서 귀에 달은 소리는 아니 들어오던지 내다보지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