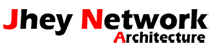새 해가 되고, 나는 새로 선발된 부대로 소집을 나가게 되었다.
그동안 새로 바뀐 것이 있었다. 바로 우리들에 대한 명칭.
‘비상근예비군’에서 ‘상비예비군‘으로 변경되었다.
‘비(非)상근’ 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개념의 ‘상비(常備)‘로 변경한 것이다.
아직 법령 개정 전으로 법적인 용어는 비상근예비군이 맞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변경을 하기 위해 법령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에
앞으로 나도 상비예비군이라는 말에 익숙해져야 했다.
새로운 부대의 사무실로 긴장 반, 설레임 반을 가지고 들어섰다.
그 전에 잠시 인사를 왔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다.
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히 새로 왔는데 책상, 의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장기비상근예비군을 3년이나 운용한 부대가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당황스러움만 내게 다가왔다.
그래도 적응해보겠다고
뻘쭘뻘쭘 있었는데
인사를 했더니 돌아온 첫 질문,
“저격은 좀 해봤나?”
아니라고 대답하자마자,
약 10분 동안 나를 세워둔 채로
호통을 들이부으셨다. 또 당황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굳이 요약하자면
1. 저격도 안해본 사람을 저격반장으로 앉히는 게 말이 되냐
2. 지원한다고 그걸 또 받아준 사령부는 뭐하는 거냐
3. 저격이 우습냐
4. 교육은 어떻게 시킬거며, 이 자리를 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게 맞느냐
정도로 일축할 수 있겠다.
우와… 내가 못 올 자리를 왔나 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다시 다가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내가 거기한테 화낸 거 아니라고…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격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이라고, 뭘 할 수 있겠냐고… 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보아
그냥 내가 어지간히 안드셨던 모양이다.
살짝 멘탈이 나가있었을 무렵
나를 담당하는 멘토가 연간 계획서를 작성하자고 파일을 보내준다는데
참 세상 차가운 태도.
세 번째 당황.
이때 일단 현역 공석자리에 컴퓨터가 남아있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에 일단 그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짜 아무 생각이 안들었다.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내가 내발로 찾아들어온 것인가…라는 생각만 한가득이었다.
이 중에 결정타는 이거였다.
정신 못차리고 있는 내게 갑자기 다가와서는
“이번에 새로온다는 장기비상근…”
“네”
“161여단…?”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냥 돌아서 가셨다.
우와… 이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냥 지금 이 부대는 상비예군은 그처 귀찮은 존재이고
이렇게 밀어내서 그만두게 해야겠다. 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는
혼자만의 못쓸 착각같은 결론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도록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새로운 부대에서의 첫 날이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