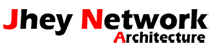그는 생각다 끝에 있는 염치를 보째 솓아 던지고 다시 한번 찾어가는 것이다. 마는 딱 맞닥드리어 입을 열고
“낼 산제를 지낸다는데 쌀이 있어야지유 ─” 하자니 역 낯이 화끈하고 모닥불이 나라든다.
그러나 그들은 어지간히 착한 사람이엇다.
“암 그렇지요. 산신이 벗나면 죽도 그릅니다” 하고 말을 받으며 그 남편은 빙그레 웃는다. 온악이 금점에 장구 딿아난 몸인 만치 이런 일에는 적잔히 속이 티엇다. 손수 쌀 닷 되를 떠다주며
“산제란 안 지냄 몰라두 이왕 지낼내면 아주 정성끗 해야 됩니다. 산신이란 노하길 잘 하니까유” 하고 그 비방까지 깨처 보낸다.
쌀을 받아 들고 나오며 영식이 처는 고마움보다 먼저 미안에 질리어 얼골이 다시 빨갯다. 그리고 그들 부부 살아가는 살림이 참으로 참으로 몹씨 부러웟다. 양근댁 남편은 날마다 금점으로 감돌며 버력뎀이를 뒤지고 토록을 주서온다. 그걸 온종일 장판돌에다 갈며는 수가 좋으면 이삼 원 옥아도 칠팔십 전 꼴은 매일 심이 되는 것이엇다. 그러면 쌀을 산다 필육을 끊는다 떡을 한다 장리를 놓는다 ─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요 꼴인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메이는 듯 맥맥한 한숨이 연발을 하는 것이엇다.
안해는 집에 돌아와 떡쌀을 담구엇다. 낼은 뭘로 죽을 쑤어 먹을는지. 웃묵에 옹크리고 앉어서 맞은쪽에 자빠저 잇는 남편을 곁눈으로 살짝 할겨본다. 남들은 돌아다니며 잘두 금을 주서 오련만 저 망난이 제 밭 하나를 다 버려두 금 한 톨 못 주서 오나. 에, 에, 변변치도 못한 사나이. 저도 모르게 얕은 한숨이 겨퍼 두 번을 터진다.
밤이 이슥하야 그들 양주는 떡을 하러 나왓다. 남편은 절구에 쿵쿵 빠앗다. 그러나 체가 없다. 동내로 돌아다니며 빌려 오느라고 안해는 다리에 불풍이 낫다.
“왜 이리 앉엇수. 불 좀 지피지.”
떡을 찌다가 얼이 빠저서 멍허니 앉엇는 남편이 밉쌀스럽다. 남은 이래저래 애를 죄는데 저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리 있는 건지. 낫으로 삭정이를 탁탁 죠겨서 던저 주며 안해는 은근히 훅닥이엇다.
닭이 두 홰를 치고 나서야 떡은 되엇다.
안해는 시루를 이고 남편은 겨드랑에 자리때기를 꼇다. 그리고 캄캄한 산길을 올라간다.
비탈길을 얼마 올라가서야 콩밭은 놓엿다. 전면을 우뚝한 검은 산에 둘리어 막힌 곳이엇다. 가생이로 느티 대추나무들은 머리를 풀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