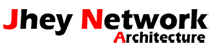“네가 허라구 옆구리를 쿡쿡 찌를 제는 은재냐 요 집안 망할 년.”
그리고 다시 퍽 질럿다. 연하여 또 퍽.
이 꼴들을 보니 수재는 조바심이 일엇다. 저러다가 그 분풀이가 다시 제게로 슬그머니 옳마올 것을 지르채엇다. 인제 걸리면 죽는다. 그는 비슬비슬하다 어는 틈엔가 구뎅이 속으로 시납으로 없어저 버린다.
볕은 다스로운 가을 향취를 풍긴다. 주인을 잃고 콩은 무거운 열매를 둥글둥글 흙에 굴린다. 맞은쪽 산 밑에서 벼들을 비이며 기뻐하는 농군의 노래.
“터젓네, 터저.”
수재는 눈이 휘둥그렇게 굿문을 튀어나오며 소리를 친다. 손에는 흙 한 줌이 잔뜩 쥐엇다.
“뭐” 하다가
“금줄 잡앗서 금줄.” “으ㅇ” 하고 외마디를 뒤 남기자 영식이는 수재 앞으로 살같이 달려드렷다. 헝겁지겁 그 흙을 받아 들고 샃샃이 헤처보니 따는 재래에 보지 못하든 붉으죽죽한 황토이엇다. 그는 눈에 눈물이 핑 돌며
“이게 원줄인가.”
“그럼. 이것이 곱색줄이라네. 한 포에 댓 돈식은 넉넉 잡히되.”
영식이는 기뿜보다 먼저 기가 탁 막혓다. 웃어야 옳을지 울어야 옳을지. 다만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재의 얼골만 멍하니 바라본다.
“이리 와 봐. 이게 금이래.”
이윽고 남편은 안해를 부른다. 그리고 내 뭐랫서 그러게 해보라구 그랫지 하고 설면설면 덤벼 오는 안해가 항결 어여뻣다. 그는 엄지가락으로 안해의 눈물을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껑충거리며 구뎅이로 들어간다.
“그 흙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이 처가 너머 기뻐서 코다리에 고래등 같은 집까지 연상할 제
수재는 시원스러히
“네. 한 포대에 오십 원식 나와유 ─” 하고 대답하고 오늘밤에는 꼭 정연코 꼭 다라나리라 생각하엿다. 거즛말이란 오래 못 간다. 뿡이 나서 뼉따구도 못 추리기 전에 훨훨 벗어나는 게 상책이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