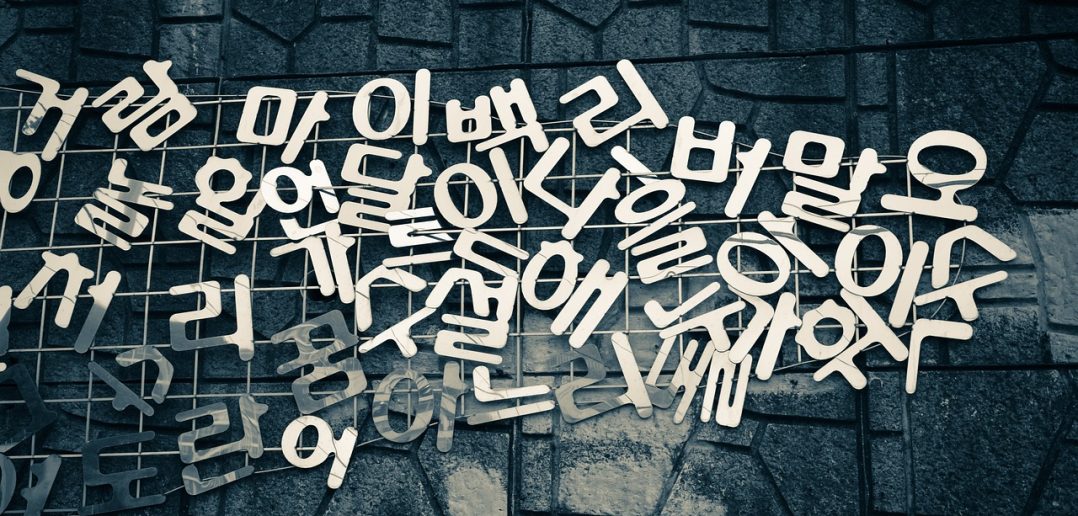• 잇노라
– 잇–(어간) + ᄂᆞ–(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 오–(1인칭 주어 화자 표시 선어말 어미) + –라(평서형 종결 어미)’의 구성이다.
– ‘써 잇노라’는 문맥상 시제는 현재에고 동작상은 완료상이므로, 현대어로 해석하면 ‘쓰고 있다’가 된다.
• 현대어 ‘잎’의 옛말은 ‘닢’이다. 원래 ‘닢’으로 표기하던 것이므로 ‘ㄴ 첨가’ 현상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 즉, ‘닢 → 닙 → 잎’의 과정을 거쳐 ‘닢’이 현대어 ‘잎’으러 표기가 바뀐 것은 두음 법칙에 따라 ‘ㄴ 탈락’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닫’은 당시의 실제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지만, ‘좃ᄂᆞᆫ가’의 받침은 당시의 실제 발음이 아니라 7종성 받침 표기에 따라 적은 것이다.
• ‘좇다’는 ‘쫓다’의 옛말로, 근대 국어 시기에는 받침이 ‘ㅅ'(좃다)으로 표기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좇–’으로 표기된다.
• ‘으란’은 어떤 대상을 특별이 정하여 가리킴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현대 국어의 보조사 ‘은/는’ 또는 ‘알랑’에 해당한다. 한편, 현대 국어의 ‘이랑’은 ‘와/과’와 동일한 의미로, 부사격 조사과 접속 조사로 쓰인다.
• 8종성 규정과 7종성 규정
15세기에는 ‘ㄱ, ㄴ, ㄷ, ㄹ, ㅂ, ㅁ, ㅅ, ㅇ’의 8개 자음으로 받침을 표기하였다(8종성 규정). 그러나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ㄷ’과 ‘ㅅ’의 발음을 구별하였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ㄷ’과 ‘ㅅ’의 종성 표기가 혼란스러워져 종성의 /ㄷ/을 ‘ㅅ’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제시된 작품에서 ‘좆ᄂᆞᆫ가’는 ‘좇다’를 근대 국어 시기의 받침 표기에 따라 ‘좃다’로 슨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기상 7종성법의 원리일 분 다시의 실제 발음대로 적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