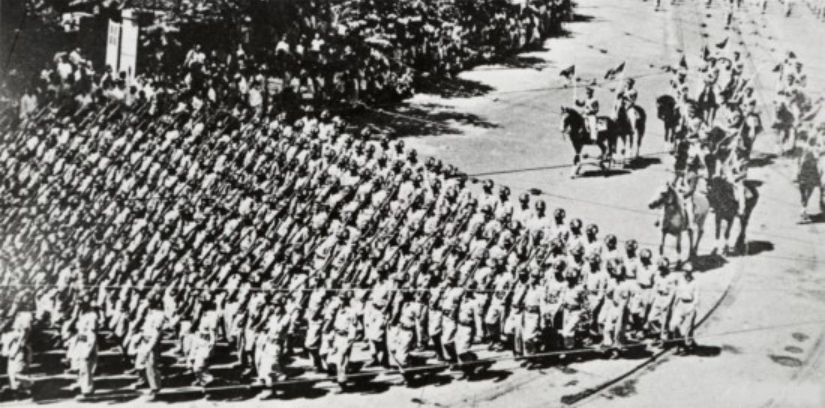1948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라 남한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치안유지,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통일된 자유민주국가 수립을 돕기 위해 남한에 들어왔던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문제는 1947년 한국 정부의 수립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미 국무부와 육군부(陸軍部)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아울러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의 성격과 한국의 안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을 방위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외부의 대규모 침공이 아니라 내부의 치안유지와 제주 4⋅3사건을 비롯하여 여순 10⋅19사건과 38도선에서의 무력충돌 등과 같은 소규모 국경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군 육성이 그 당시 미국 군부의 한국군에 대한 군사목표였다.
미국의 고위 정책 및 전략가들은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외부에 의한 전면적인 군사적 침공이 아니라, 당시 태평양상의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전복활동이나 침투와 같은 문제를 더 우려하였다. 이는 애치슨이 1950년 1월 12일 연설에서, “태평양 지역의 다수의 나라들이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보다는 내부의 경제적 곤란, 사회적 혼란 때문에 공산권으로부터의 전복행위, 침투행위에 취약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90) 즉 애치슨은 태평양상에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외부의 침략위협 보다는 내부의 경제적 혼란과 전복 및 침투 등과 같은 국내의 내부혼란을 더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듯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후 군사원조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군사적 공격이 아닌 내부의 혼란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경제 원조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이에 군사력도 소규모 국경충돌 내지는 치안유지에 적합한 방어형 성격의 한국군 건설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군의 훈련을 돕는 군사고문단만 남겨 놓게 되었고,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원조도 전투기나 전차 등과 같은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위주의 군사원조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미국 스스로가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낮게 평가해서 철수한 한국에 대해 소련이 장차 미국과의 전면전을 치를지도 모를 침략전쟁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소련은 그 틈새를 이용하여 주한미군이 철수한 한국을 미국이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사주하였던 것이다.
90) Dean Acheson, “Crisis in Asia-An Examination of U. S. Policy,” Department State Bulletin, vol. 22. 551,
January 23, 1950, p. 116